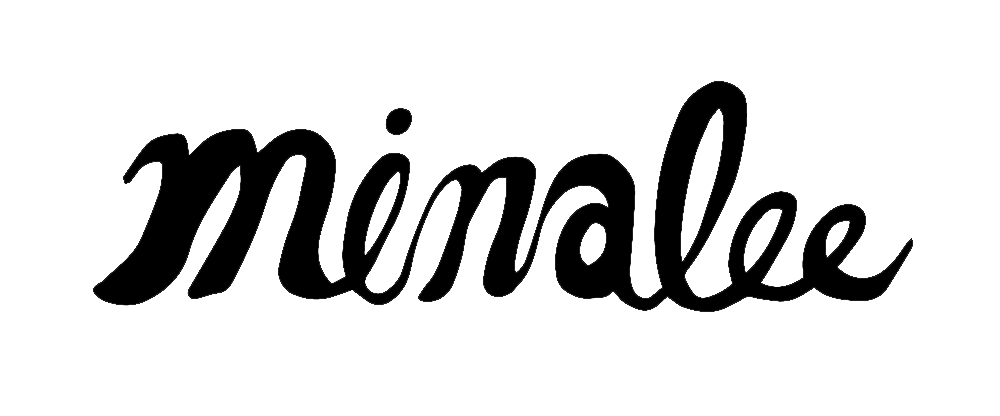100 Squares
2022.6.17 - 7.3
brave sunshine gallery
minalee solo exhibition



<100개의 네모> 2021-2022
no.1 - no.104
나무 판넬에 유채
각 15.8 x 22.7 (cm)
처음 작은 나무를 만지게 된 건 화방 지하였다. 캔버스와 나무판넬이 채워진 지하 구석에 나무가 쌓여있었다. 유화를 시도해보는 중이었다. 계속 종이에만 그리다가 캔버스에 그려보니 천이 미끌거리고 종이에 그리는 방식과 다르게 그려졌다. 다른 바탕은 없을까하다가 나무를 찾았다.
나무를 이러 저리 쌓아보니 장난감 블록쌓기를 하는 것처럼 기분이 가벼워졌다. 나무의 결은 캔버스보다 거칠고 단단해서 책상 위에서 종이를 그릴 때 꾹꾹 눌러썼던 방식과 비슷하게 그려졌다. 크기도 작아서 금세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연습은 원래 쉽게 성과가 안나는 법이니까 여러번 그림을 채우며 지치지 않고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네모 몇 칸을 채우면서 그림이 만들어지고 그들끼리 쌓여두니 테트리스처럼 보였다. 일정 기간에 그린 것들끼리 비슷한 내용이나 색이 겹쳤다. 노랑이 좋던 시절, 무채색이 좋던 시절.
매일 매일 꾸준히 그린 것은 아니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답답해지거나 환기가 필요할 때 나무를 찾았다. 네모 나무. 뭘 그려도 금방 채워지는 작은 네모는 은근한 만족감을 줬다. 나무의 질감을 만지는 것도 좋았고 다 다른 무늬인 것도 좋았다. 지루하지 않았다.
나무 위에 젯소를 바르고 그 위에 물감으로 그렸다. 처음에는 유화라는 재료가 어색해서 한겹씩 천천히 그리다가 점점 익숙해지면서 빠르게 드로잉하듯이 그렸다. 전시에는 초반에 그린 그림부터 가장 최근까지 그린 그림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늘어놓아서 어떤 순간에는 어설프고 어떤 순간에는 자유롭다가 또 다시 어색해지는 작업의 과정이 담겨있다.
최대한 다양한 동물과 식물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지만 막상 작은 나무 앞에 앉으면 익숙한 동물과 식물을 많이 그렸다. 늑대, 고양이, 개, 가끔 오리, 치타. 그래도 괜찮았다. 어떤 눈치나 목적없이 그리는 기분이 제일 중요했다.
어떤 동물은 사진을 보고 상상을 더해 그리거나 어떤 것은 구상보다는 추상에 가깝게 그렸다. 그럴 때는 선 옆에 면, 색 옆에 어떤 색을 올려야 서로 잘 어우러질까 생각했다.
기름 먹은 물감이 다 마르면 반짝거렸다. 초반에는 그간 그려온 동물의 초상을 그리고, 중간 중간 산책하며 본 식물이나 꽃집에서 본 꽃을 그렸다. 1번부터 45번까지는 2층의 해가 잘들던 작업실에서 지내며 그린 것이고 나머지는 작업실을 이사하고 1층의 해가 거의 안드는 작업실에서 그린 것이다. 좁아지고 어두워진 공간에 울적했었다. 기분 전환으로 그림을 그렸다. 이사를 하고 다른 작업들을 병행하느라 앞의 것들과 뒤의 것들은 시간 상 꽤 차이가 있다.
네모 작업 사이에는 다른 작업들이 있었다. 그림책, 페인팅, 세라믹, 패브릭, 조그만 인형 만들기, 드로잉. 네모 작업은 밭에 핀 잡초처럼 그 사이 사이에 자랐다. 자라서 하는 작업들마다 말을 걸었다. 서로 왕래하듯 그림을 그리고 오브제를 만들었다.
뒤의 순서로 갈수록 화면 안에 여러 동물을 채우고 싶어졌다. 털달린 동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잘 모르지만 서로의 온기에 꼭 붙어있는 거라 짐작해본다. 사실 둘 중 하나는 좀 성가실지도 모르지만….
여럿이 있는 그림 속에서 여러 감정이 생겨났다. 좀 더 구체적인 기분이었다. 온도가 있고, 촉감도 상상할 수 있다. 태어난 것들은 원래 외롭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서로 기대는 동물을 그릴 때면 존재들 사이의 다양한 감정이 외로움을 가려주는 것 같았다. 귀찮음, 성가심, 기대, 포근함, 허기, 안락함,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자리를 채웠다.
한참 그리다가 네모의 숫자를 세어보니 100개가 좀 넘었다. 100이라는 숫자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지만 더이상 이 크기의, 이 비율의 판넬을 사고 싶지 않아졌다. 좀더 길쭉하거나… 다른 모양의 네모가 궁금했다. 화면이 좁게 느껴졌다. 내가 그리고 싶은 것들이 커진 것인지 그려내고 싶은 것들이 많아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다양한 네모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100 squares